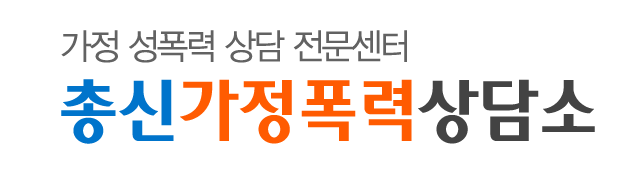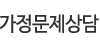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모순성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후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9월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1년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이 2013년 10월,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급부상했다.
법안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열자는 당시 야당의 의견 등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죽어야 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주장에 밀려났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안 검토 끝에 2013년 12월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9월 29일 전격 시행됐다.
불행하게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학대행위자가 법적 보호자인 까닭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2020년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괴물'로 변한 것일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관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네 가지 응급조치란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경찰관에게 사적 공간인 가정의 사안에 개입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전체 3만7605건 중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9%인 3369건이다. 응급조치 내용은 3호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41.6%, 1호인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28.6%, 2호인 학대 행위자 격리 25.9%, 4호인 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4% 순이다.
전체사례의 9%에 해당하는 3369명의 아동이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 의해 아동학대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폐쇄 공간인 가정과 달리 학교는 출동한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교사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 아동을 교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학교는 '2014년 9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같은 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와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벌금의 최소단위인 벌금 5만 원으로도 사실상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총선 후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9월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1년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이 2013년 10월,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급부상했다.
법안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열자는 당시 야당의 의견 등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죽어야 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주장에 밀려났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안 검토 끝에 2013년 12월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9월 29일 전격 시행됐다.
불행하게도 심각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학대행위자가 법적 보호자인 까닭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2020년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긴급히 현장에 출동해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괴물'로 변한 것일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관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네 가지 응급조치란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경찰관에게 사적 공간인 가정의 사안에 개입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전체 3만7605건 중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9%인 3369건이다. 응급조치 내용은 3호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41.6%, 1호인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28.6%, 2호인 학대 행위자 격리 25.9%, 4호인 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4% 순이다.
전체사례의 9%에 해당하는 3369명의 아동이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관에 의해 아동학대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폐쇄 공간인 가정과 달리 학교는 출동한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교사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 아동을 교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격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